[백성호의 예수뎐]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마태오 복음서 7장 7~8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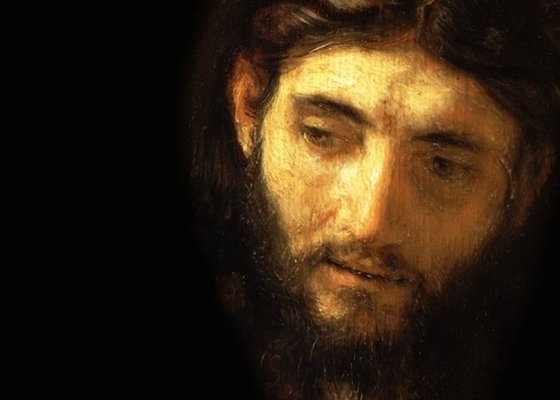
종교는 늘 두 가지 길로 갈라질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기복종교이고, 또 하나는 영성의 종교이다. 렘브란트가 그린 예수의 초상화. [중앙포토]
마술 같은 소리가 아닌가. 청하면 받는다니, 찾기만 해도 얻는다니, 문을 두드리기만 해도 열린다니 말이다. 한마디로 ‘도깨비방망이’다. “금 나와라! 뚝딱!” 하고 땅바닥을 두드리기만 해도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은 나와라! 뚝딱!” 하고 내려치기만 해도 바라는 대로 우수수 쏟아진다. 그런 종교라면 “믿습니다!” 한마디에 온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갈 것이다.
(41) 그리스도교는 영성의 종교인가, 욕망의 종교인가
그런 점에서 이 구절은 다소 위험하다. 왜일까. ‘왜곡의 지뢰’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은 모두 얻을 수 있다. 네가 하는 사업도 번창할 것이고, 자식의 대입 수능도 문제없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심어준다. 그렇기에 이 구절은 그리스도교를 ‘강력한 기복 종교’로 탈바꿈시키는 성경적 근거로 작용하기도 한다. 실제로 그렇게 설교하는 목회자도 있고, 그렇게 믿는 신자들도 있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 말을 듣고서 고개 들지 않을 욕망이 있을까. 이 말을 듣고서 청하고 싶지 않은 욕망이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은 청한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앞에서 자기 안의 욕망을 청한다. 그런 광경을 볼 때마다 나는 물음이 올라온다.
‘그리스도교는 영성의 종교인가, 아니면 욕망의 종교인가?’

성경에는 예수가 눈 먼 사람이 앞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이적의 일화도 녹아 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본다는 이야기에 담긴 깊은 뜻은 어떤 걸까. [중앙포토]
삶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한쪽은 에고를 키우는 길이고, 다른 쪽은 에고를 치우는 길이다. 한쪽은 ‘나의 뜻’을 따르는 길이고, 다른 쪽은 자신의 뜻이 무너진 곳으로 드러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길이다. 예수는 후자를 따랐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은 채 그 길을 따랐다.
그러니 예수가 설한 그리스도교는 ‘욕망의 종교’가 아니라 ‘영성의 종교’였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길이 싫은 걸까. 왜 자꾸만 거꾸로 가고 싶은 걸까. 어째서 ‘영성의 종교’가 아니라 ‘욕망의 종교’를 따르고 싶은 것일까.
‘욕망의 눈’으로 보면 성경 전체가 ‘도깨비방망이’이다. 하지만 그 눈을 허물고 보면 다르게 보인다. 성경은 과학이다. 자기 자신과 인간과 세상과 우주의 존재 원리에 대해 설명하는 깊은 과학이다. 예수는 온갖 비유를 들어 그 속에 흐르는 이치를 풀어놓았다. 그런 비유들이 우리가 가진 ‘욕망의 눈’을 관통하며 왜곡될 때 문제가 된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했던 예수의 기도가 우리의 눈을 통과하면서 “아버지 뜻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하소서”라는 기도가 되고 만다.
2000년 전에도 숱한 이들이 예수를 찾아왔다. 몸이 아픈 이도 있고, 마음이 아픈 이도 있었다. 삶에 대한 물음을 도무지 풀지 못해 찾아온 이도 있었다. 그들을 향해 예수는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했다. 또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는다”라고 했다. 왜 그랬을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느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다”라며 ‘기복적 태도’를 신랄하게 공격했던 예수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예수가 말한 청함과 두드림에는 어떤 뜻이 숨어 있을까.

숱한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아왔다. 그리고 자기 삶의 문제를 물었다. 예수는 그들에게 하늘의 눈으로 해법을 내놓았다. [중앙포토]
불교의 『금강경』에는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이라는 구절이 있다.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뜻이다. 여기서 ‘머무름’은 집착을 말한다.
가령 어제 점심때 억울하고 불쾌한 일을 당했다고 하자. 하루가 지났지만, 자꾸만 생각난다. 어제 일은 시간과 함께 이미 흘러가 버렸는데도 자꾸 떠오른다. 왜 그럴까. 내 마음이 ‘그일’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끈적끈적한 접착제를 바른 채 ‘그일’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때는 마음이 흘러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문다.
무언가 청하는 일. 무언가 찾는 일. 간절하게 문을 두드리는 일. 그 모두가 ‘마음을 내는 일(生心)’이다. 기도도 마찬가지다. 신의 마음을 향해 내 마음을 일으키는 일이다. 그렇게 일으킨 마음이 신의 마음으로 흘러들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것이 기도다. 우리는 그렇게 청하고, 그렇게 찾고, 그렇게 문을 두드린다.

갈릴히 호수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의 유적지. 예수는 이 일대에 머물며 설교를 다녔다고 한다. [중앙포토]
그런데 기도할 때 ‘착(着)’이 생기면 어찌 될까. 애착이든 집착이든 말이다. 그러면 브레이크가 걸린다. 자신이 아무리 마음을 일으켜도 ‘접착제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붓다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라고 했다. 그 구절 앞에 ‘마땅히’라는 말까지 넣었다. 붓다는 왜 그 말을 넣었을까.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라는 대목 앞에 왜 ‘마땅히’라는 단어를 굳이 집어넣었을까.
그게 이치이기 때문이다. 빗방울은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다.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 지지 않는다. 강물도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아래에서 위로 역류하지 않는다. 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낙엽이 진다. 그것이 이치다. 인간과 세상과 우주를 관통하는 신의 섭리다.

노을 지는 갈릴리 호수 위를 새들이 날아가고 있다. 2000년 전 예수도 똑같은 풍경을 보지 않았을까. [중앙포토]
이와 마찬가지다. 붙들고 있으면 마음이 흐를 수가 없다. 붙들지 않을 때 마음이 흘러간다. 그렇게 흘러야 건너갈 수 있다. 내 마음에서 신의 마음으로 건너갈 수 있다. 그렇게 마음이 통할 때 비로소 기도도 통한다. 그러니 우리가 무언가를 붙들 때보다 무언가를 내려놓을 때, 기도가 더 잘 흐르지 않을까. 나의 마음과 신의 마음이 더 잘 통하지 않을까.
'성경과 세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유대인 이야기 -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0) | 2022.05.31 |
|---|---|
|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0) | 2022.05.17 |
| 만나는 지금도 내리고 있다 (0) | 2021.11.12 |
| 빅뱅 이전에 빛이 있었다(요한복음) (0) | 2021.10.30 |
| 스페인 무적함대 패배는 물 때문 -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0) | 2021.07.27 |